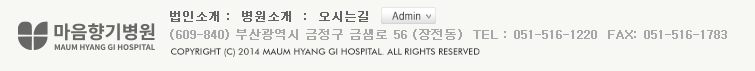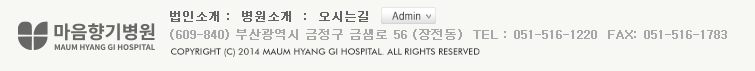|
2500년 된 질병, 우울증의 실체가 궁금하다
|
|
|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3-02-13 조회 : 1,488
|
| 관련링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0/2023021001430.html [853] |
우울증은 열 명 중 한 명이 걸린다.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세상 사람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흔한 질병이다 보니 관련 정보도 넘쳐난다. 클릭 몇 번이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의뭉스럽게 묻는다. “우울증, 도대체 그게 어떤 병인가요?”
우울이란 단어는 다방면에 쓰인다. 병이 아니라 그저 기분 상태를 묘사하고, 근심이 많거나 기운이 없어도 두리뭉실하게 “우울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우울증에 걸렸어”처럼 메타포로도 쓴다. 여기저기서 들리니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답답해한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물어도 의사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정확한 원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불안한데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잠을 못 자는데 왜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증상이 다양하고, 여러 정신질환에 공존하는 게 이 병의 특징이다.
우울장애의 진단 범주는 넓다. 우울증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극성 우울장애도 있고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양극성장애도 있다. 비정형 우울증은 많이 자고 많이 먹는 게 특징이다. 봄이나 가을에만 재발하는 계절성 우울증도 있고, 경미한 우울증상이 2년 이상 계속 되면 지속성 기분장애다. 갑상선 호르몬 저하나 다이어트 약 부작용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질병인지 성격인지 헷갈리는 사례도 많고, 폐경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족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에도 증세가 심하면 애도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가끔 우울증을 ‘쓰레기통’이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순수하지 못한 건 오염된 것이니 몽땅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극단적 주장처럼 듣기 거북하다. 기원전 4~5세기경부터 시작된 우울증의 장구한 역사,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관찰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쌓아온 의학자들의 헌신이 우울증이라는 진단에 녹아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진료 시간이 짧으면 의사가 환자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기 어렵다. 이거다, 저거다 발병 이유를 딱딱 짚어줄 수 없다.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진단이 바뀔 때도 있다. ‘이 의사를 믿어도 될까?’ 의심하는 환자도 적지 않을 거다. 의사의 능력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울증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마음은 게다가 보이지도 않는다. 100%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덜컥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알려진 사실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하면 된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도 정확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일주일 만에 안 낫는다. 침대에 누워서 푹 쉬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다. 직장인에게 흔한 소진증후군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위로와 응원만으로 우울증이 완치되진 않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0/2023021001430.html
|
|